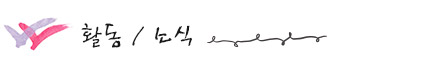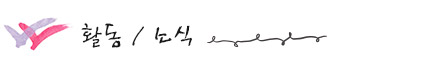정성껏 준비해 주신 발제문을 허락을 받고 공유합니다. 세미나 풍경은 페이스북 <신영복다르게읽기> https://goo.gl/dJPPX1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하혁진님 발제문 시작부분 나는 1996년 4월 2일에 서울에서 태어났다.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태어나보니 이 나라였고 그렇게 나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었다.... 나는 세월호 참사 당시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이었다. 친구들과 함께 떠나는 수학여행의 설렘을 느꼈던게 엊그제였기에 그 슬픔이 더 크게 느껴졌다. 이렇게 세월호 침몰 사고로 희생된 304명의 희생자 중 단원고 학생들과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을 세월호 세대라고 한다. 한 세대를 규정하기에 이보다 더 슬픈 표현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 슬픈 표현 외에도 우리 세대를 수식하는 몇 가지 수식어들이 더 있다... 김성장님 발제문 끝무렵 ...궁체의 창작 주체와 궁체가 쓰여진 작품과 문서의 사용자의 측면을 볼 때 궁체는 귀족들의 것이었고 일반 서민의 접근 자체가 제한되어 있었다. 신영복의 글씨는 기존의 서단이 가진 질서와 권위 밖에서 시작되고 확산되었다. 신영복 민체의 형성은 궁체가 가진 엄정, 단아, 절제, 겸손, 인내의 궁중적 귀족적 정서를 이탈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신영복은 궁체의 그러한 미감과 권위를 해체하거나 자신의 감정을 풀어헤치는 방향으로 나아간 것이다. 수직적 상하 질서에 순응하는 겸손보다는 타자와 대등한 자세를 가지려는 당당함, 권위에 대한 복종보다는 거부와 도전의 몸짓, 억압보다는 해방, 현재의 감정을 다스리는 절제보다는 감정을 표현하고자하는 능동성 등의 미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발제문 전체보기 : https://goo.gl/7Tt0Wa
|